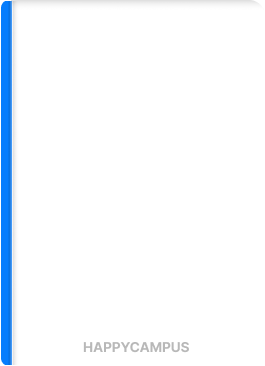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의 확대와 관련된 여러 문제 - 현행법을 중심으로 - (L'élargissement du concept de 'acte administratif coréen(處分)' et d'autres problèmes qui le suivent - L'accent est mis sur les législations actuelles -)
33 페이지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1.12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18호 / 179 ~ 211페이지
· 저자명 : 이광윤
초록
한국행정소송법의 ‘처분’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의 ‘구체성’을 요소로 하여, 이에 더하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처분’의 요소로 정의하고 있는데 비하여 일본에서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의 ‘직접성’과 ‘구체성’을 요소로 하고 있는데, 우리 판례(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누395 판결,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8누379 판결 등)도 ‘직접성’을 ‘처분’의 요소로 보아 왔으므로 한국과 일본에서의 ‘처분’ 범위의 차이는 한국에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처분’에 포함시키는데 있고, ‘이것의 내용을 어떻게 하는가’의 여하에 따라 ‘처분’ 개념의 확대가 이루어 질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개별적결정과 행정입법 모두를 행정행위(acte administratif) 개념에 포섭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행정행위란 행정기관이 발하는 집행적 성격의 행정법상의 행위로 행정법원의 관할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행정행위는 일반적 행정행위(행정입법)와 개별적 행정행위로 나눈다. 집행적 성격의 행정법상의 행위라 함은 법적 질서(Ordonnancement juridique)에 대한 수정 또는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일방적 행위를 말한다.
독일에서의 행정행위 개념은 행정입법을 포함하지 않는 행정청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 행위에 한정된다. 독일의 행정행위 개념의 징표는 ‘1. 규율(Regelung) 2. 고권적(Hohetlich) 3. 개별사건규율(einzelfallregelung) 4. 행정청 5. 직접적 효과’ 이다.
영국에서는 행정행위 개념이 없고 행정기관의 행위 중 헌법상의 기능에 따라 행정결정(administrative decision), 사법결정, 입법결정으로 나눈다. 영국에서는 개별적 행정행위와 행정입법의 구별이 없고 행정입법에 대한 유형별 분류도 되어 있지 않다.
행정입법에 대한 선결문제로서의 간접적 통제 방법은 나라마다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직접소송에 의한 통제는 이를 허용하고 있는 프랑스형과 영국형 그리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 독일형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기본적으로 상이한 행정행위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행정입법에 대한 직접 소송이 매우 활발하다. 월권소송에 대한 객관적 소송관으로 인하여 행정입법의 적용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인은 행정입법의 적법성에 대하여 바로 소송을 제기한다. 행정입법에 대한 직접소송은 모든 이해 당사자를 보호한다는 호민관제도 확대의 상징적인 모습이다.
독일은 행정소송을 주관적으로 파악하여 행정법관계 일체가 행정청과 행정결정의 상대방의 상호관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대세적 효력을 인정하는 행정입법의 취소소송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1996년 11월 1일에 수정된 1960년 1월 21일 행정법원법은 행정고등재판소가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 명령들의 유효성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란트 법률들이 명시하는 경우에는 게마인데나 크라이스의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 명령들의 유효성에 대하여 행정재판소의 관할권이 있다(북라인 - 웨스트팔리아, 베를린, 함부르크, 자르 제외). 그러나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권리를 침해당했거나 당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만이 명령의 공표로부터 2년 이내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법원법 제47조 제2항).
영국에서 위임입법은 행정청의 다른 행위들의 유효성에 대한 통제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통제를 받는다. 가장 자주 사용되는 소송은 확인소송(declaration)과 규칙(rules)을 수정하는 명령소송(Injunction)이다. 적극적으로 입법을 요구하는 입법명령소송(mandatory order 또는 mandamus)도 가능하다.
리스본 조약 제263조 제4항은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은 그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 또는 직접적이고 개인적으로 관계되는 행위 또는 직접적으로 관계되고 집행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명령적 행위(actes réglementaires)를 대상으로 …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개인이 직접 제기할 수 있는 취소소송의 대상에 명령을 추가하고 있다. 리스본 조약 제263조 제4항에서는 ‘직접성’ 만을 요건으로 하여, 개별적 행위든, 행정입법(명령)이든 모두 직접소송의 대상이 된다.
한국에서는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은 소위 행정행위의 학문적 개념이라고 하는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력적 단독적 공법행위”에다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추가하고 있으므로 무엇이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가는 판례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다.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로 이해하여 소위 학문적 행정행위개념에 충실한 것이 기본적인 태도였으나, 점차 행정행위의 개념을 상대화하여 처분성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처분’은 첫째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이므로 행정입법도 그 범위가 특정되면 ‘처분’에 해당한다. 둘째, 범위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대한 직접성’이 인정되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여 ‘처분’이 된다. 행정소송법은 ‘처분’의 요건으로 ‘개별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소송법 규정을 이유로 하여 행정입법을 항고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할(범위가 특정되기만 하면) 근거가 없다. 행정입법이 처분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성’은 행정소송법 자체가 요구하는 요건인 반면, ‘직접성’은 판례가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규정이나 판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개별적 관련성은 요구하지 않는다.
사실행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 할 수 없는 것을 문제점으로 삼는 경우도 있으나 사실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것’(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대법원 2003. 10. 9. 자 2003무23 결정,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6161 판결), 즉 법적 질서(Ordonnancement juridique)에 대한 수정 또는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형식적 행정행위 개념은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가 아니므로 한국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
선결문제소송만 가지고는 위법한 행정입법으로 인한 장래에 발생할 무수한 위법상태를 방치하는 결과가 되므로 직접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현재의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규정은 ‘구체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일반ㆍ추상적 행위와 개별ㆍ추상적인 행위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통하여 추상적 위법상태를 제거함으로써 장래에 발생할 위법상태를 일거에 제거하는 효율적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은 구체성과 직접성만을 요소로 하여 추상성을 요소로 하는 개별ㆍ추상적인 행위나 일반ㆍ추상적인 행위는 직접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치국가의 원리에 비추어 결함이 있고, 국민의 권리보호에도 미흡하므로 이를 모두 직접소송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행정소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107조 ②는 헌법 제107조 ①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여 법률에 대한 선결문제 소송 관할을 규정하고 있는 데에 이어서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선결문제 소송 관할을 규정하고 있는 것임은 조문의 구조나 문맥상 명백하다.
“헌법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가 처분인 행정입법에 대한 직접소송(항고소송)의 근거로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헌법 제101조 ①의 ‘사법권’ 이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되는 법원(헌법 제101조 ②)이 보유하는 ‘형식적 사법권’을 의미하기 때문에(헌법재판소는 따로 규정) 법원이 어떠한 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법률들의 내용에 달려 있다.
행정입법에 대한 직접소송제도에 관하여 헌법은 침묵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입법에 대한 추상적 직접소송 제도를 행정소송에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위헌문제가 제기될 수는 없다.
헌법 제101조 ①은 행정재판권을 형식적 사법권에서 분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동급의 최고법원인 행정최고법원의 설치는 물론 헌법적 사항이지만 현행 헌법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므로, 법률로써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위헌으로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행정입법은 행정권(형식적 의미의 행정권으로 헌법 제66조 ④에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가 보유하는 행정권+헌법 제114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유하는 행정권+헌법 제117조 ①에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행정권+헌법이 침묵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행정청이 보유하는 행정권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광의의 행정권)의 중요한 행정활동이므로 행정법원의 직접적 통제를 받는 것이 법치국가의 원리상 타당하다.영어초록
L’article 2 alinéa 1 de la loi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définit "處分 etc."(acte administratif etc. ; Verfu"gung etc.) comme "exercice ou refus de puissance publique et actions administratives semblables comme exécution de la loi et le règlement par les autorités administratives concernant les faits concrêts". Cette définition est le résultat de modification du projet de loi qui définissait tout simplement "exerciceou refus de puissance publique et actions administratives semblables." Au Japon, la jurisprudence interprète "處分" comme "actions des autorités administratives par la loi et le règlement qui forment directement des droits et des obligations des peuples ou déterminent ses critères. L'accent sur "les faits concrêts" par les juristes coréens reflète cette influence de la science juridique allemande. Mais, en Corée, Nous pouvons élargir le concept de "處分 "(acte administratif ; Verfu"gung) en élagissant le critère des actions administratives semblables.
En France, les actes administratifs unilatéraux sont des actes par lesquels l’administration modifie l’ordonnancement juridique. Les actes administratifs unilatéraux sont de deux types : les actes réglementaires et les actes individuels.
Les allemands adoptent une notion plus étroite : Le destinataire de l'acte est toujours une ou plusieurs personnes dérerminées et non une catégorie abstraite de personnes.
Le Droit englais ignore la notion d'acte administratif et utilise les notions d'acte exécutif, d'acte quasi-juridictionnel et d'acte quasi-législatif de l'administration. L'acte quasi-législatif désigne l'acte réglementaire.
Le contentieux direct des réglement administratifs est le plus développé en France. L'exemple a été suivi de façon assez restrictive en Allegmagne qui a adopté une conception subjectiv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Les juristes anglais sont unanimes pour considérer que les actes de législation déléguée obéissent pour l'essentiel aux mê̂me Règles de validité que les autres actes de l'administration. Toutes les voies de recours utilisables en contentieux administratif sont utilisables pour contester la validité d'un réglement.
Versions consolidées du traité sur l'Union européenne et du traité sur le fonctionnement de l'Union européenne(2008/C 115/01), article 263 alinéa 4 stipule ;"Toute personne physique ou morale peut former,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x premier et deuxième alinéas, un recours contre les actes dont elle est le destinataire ou qui la concernent directement et individuellement, ainsi que contre les actes réglementaires qui la concernent directement et qui ne comportent pas de mesures d'exécution."La loi coréenn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ne demande pas 'l'individualité' comme un facteur de "處分"(acte administratif ; Verfu"gung). Elle demande seulement 'ê̂tre concrê̂t'. Et la jurisprudence y ajoute 'ê̂tre direct'.
L'acte réal ne peut pas ê̂tre l'objet du contentieux de la légalité. Parce qu' il ne modifie ou influence pas l'ordonnancement juridique. Le concept de 'l'acte administratif formel japonais ne peut pas ê̂tre reconnu en Corée. Puisqu'il n'est pas l'exercise ou le refus de la puissance publique qui a l'effet juridique.
L'exception d'illégalité seule n'est pas suiffisante pour la protection des droits des peuples. Pour introduir le contentieux direct contre le réglement administratif, il faut supprimer 'concernant les faits concrêts' dans l’article 2 alinéa 1 de la loi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La constitution(article 101 ① et ②) garde la silence concernant le contentieux direct contre le réglement administratif. Donc l'intrduction du contentieux direct contre le réglement administratif ne soulève pas des problèmes de l'inconstitutionalité.
En tant qu'une des activités principales de l'administration, le réglement administratif doit ê̂tre contrô̂lé directement par la cour du point de vue du principe de l'Etat du Droit.참고자료
· 없음태그
- # réglement administratif
- # contentieux direct
- # contentieux de la légalité
- # loi coréenn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 # "處分"(acte administratif
- # Verfu"gung)
- # actions administratives semblables
- # élargissement du concept de 'acte administratif coréen
- # inconstitutionalité.
- # 처분개념의 확대
- # 행정입법
- # 행정행위
- # 선결문제소송
- # 사실행위
- # 형식적 행정행위
-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 형식적 의미의 사법권
- # 형식적 의미의 행정권
- # 행정입법 직접소송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법”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
리스자동차의 유지ㆍ관리책임에 관한 私法的 고찰 30 페이지
현대적 의미의 리스영역에서 고유하게 생성되어 새로운 법칙으로 체계화되고 관행화된 리스법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 제1항, 2010년 개정상법 제168조의3 제4항 등에서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에 대한 유지ㆍ관리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리적용 내지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리스에서의 이러한 법리적용 내지 입법 취지는 리스거래구조와 특질 및 물적 금융으로서의 .. -
기업회생절차의 새로운 패러다임 53 페이지
경영권 교체를 원칙으로 운영되던 구 회사정리절차는 2006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의 시행에 따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DIP)를 원칙으로 하는 기업회생절차로 통합되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상 채권자협의회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에 대한 감독자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채무자회생법상 기업회생절차가 .. -
토지거래허가를 배제ㆍ잠탈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42 페이지
이 글은 토지거래허가를 배제ㆍ잠탈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판결에 대한 해설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도의 실질을 달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원상회복을 구하지도 않을 경우 그와 같은 양도차익에 .. -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영업양도 - 미국 연방도산법 제363조 매각 및 일본의 재생계획 등에 의하지 아니한 영업양도를 통한 .. 81 페이지
우리나라의 회생사건실무에서는 합병, 분할, 신회사의 설립, 제3자 배정 신주발행, 영업양도 등 다양한 형태의 M&A를 실시하고 있다. 그 중 영업양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회생계획에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영업양도는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영업양도를 명시적으로 도입..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