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바르뜨리하리의 자띠사뭇데샤 (‘Jāti-samuddeśa’ of Bhartṛhari)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0 페이지
최초등록일 2025.04.11
최종저작일
201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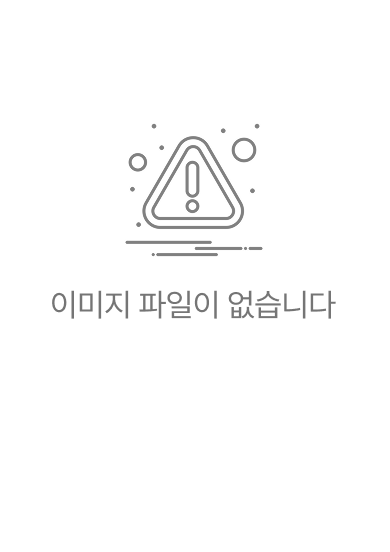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남아시아연구 / 18권 / 1호 / 169 ~ 188페이지
· 저자명 : 최종찬
초록
본고는 바르뜨리하리의 ‘자띠사뭇데샤’(보편론)의 내용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자띠사뭇데샤’는 『와꺄빠디야』3권에서 다루어지는 단어의 의미와 관련된 주제들의 배경이 되는 도입부분으로서 언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과 철학적 견해들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고의 Ⅱ장에서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Ⅲ장에서는 단어와 의미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보편의 개념을 분석한다. Ⅳ장에서는 보편을 문법학과 철학에서 사유된 개체, 궁극적 실재, 유사, 집합 등의 개념과 비교함으로써 그 특성을 규명하고 나아가 보편의 실재성과 영역에 대한 철학적 견해들을 인지와 관련하여 분석한다.
바르뜨리하리는 그의 보편론을 위해 기본적으로 문법학적 측면에서 단어의 의미를 다루었다. 또한 그는 보편에 대한 여러 철학적 견해를 수용하면서 보편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언어와 관련된 그의 기술에 따르면, 모든 단어는 보편을 의미한다. 단어를 이루는 어근이나 어간 그리고 접사는 모두 보편을 표현하며 이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 단어가 보편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보편을 한정하는 요인이 필요하며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단어보편이다. 단어는 단어보편과 의미보편의 겹쳐짐을 통해 보편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어보편의 개념은 보편의 보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승론철학의 제약을 받는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바르뜨리하리는 단어의 의미는 사물의 실상이 아니라 단어의 실제 기능에 따른다는 문법학의 견해를 제시한다. 보편을 언어학적 시각에서 정의할 때 언어관습은 다른 모든 기준을 우선하는 것이다. 한편 승론철학은 모든 단어가 보편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은 대상들이 공통된 특성을 지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유식론자들은 보편이 외적 대상들이 지닌 공통된 속성보다는 마음에 새겨지는 공통된 표상에 근거한다고 보았다. 바르뜨리하리는 이와 같은 견해들을 제시하면서 단어의미와 관련하여 보편을 정의할 때 인지적 측면의 중요성을 또한 언급하였다.
보편은 개별과 비교해볼 때 영속적인 개념으로 개체의 원인이 되며 개체는 보편이 머무르는 기체가 된다. 불이론적 입장에서 보면 보편과 개별은 상대적인 것으로서 실재적인 것이 보편이라면 상대적으로 비실재적인 것은 개별이 된다. 단어들이 의미하는 보편은 가장 높은 단계의 보편인 브라흐만의 비실재적 현현 또는 구분일 뿐이다. 모든 단어들은 직접적으로 보편을 나타내며 간접적으로 궁극적 실재인 브라흐만을 나타내는 것이다.
유사와 집합은 보편과 비슷한 특성을 보이는 개념들이다. 이 셋은 인지의 다양성과 동일성을 기준으로 서로 연관되는 개념들이다. 다양함과 동일함이 함께 인지되는 것이 집합이고, 그 둘이 순차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유사이며, 동일함만 인지되는 것이 보편이다. 보편은 또한 유사나 집합과는 달리 개체의 속성이라기보다는 개체와는 다른 별개의 존재로 상정된다.
끝으로 바르뜨리하리는 인지와 관련된 두 견해를 제시한다. 우선 불교학파는 보편을 일종의 오류로 본다. 모든 인지는 서로 다르며 인지의 동일성 같은 것은 없다. 하지만 습기(習氣)로 인해 인지들은 동일한 것처럼 보이고 이를 바탕으로 보편의 개념이 생긴다. 한편 연관론자들에 따르면 인지는 인지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인지에는 보편이 존재하지 않는다.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analyse Bhartṛhari’s theory of universal. In order to accomplish the theory of universal, he deals with the meaning of words from the linguistic viewpoints. He also tries to define the concept of universal by introducing various philosophical views.
According to Bhartṛhari’s theory of universal, all words, including stems, roots and suffixes, denote universals. The stem or the root denotes the universal of a thing or an action and the suffix denotes the universal of number etc. and the two are correlated. For a word to denote a universal, a limiting factor of the universal is required. A word-universal was stated as the limiting factor which serves as the occasioning ground for the denotation of a universal. A word-universal, being superimposed on a meaning-universal, helps a word denote a universal. However the concept of word-universal goes against the Vaiśeṣika ontology such that a universal has no further universal. Bhartṛhari removes the Vaiśeṣika principle by introducing the viewpoint of the grammarians that all words denote a universal without resorting to the concept of superimposition(adhyāsa). According to the Vaiśeṣikas, all words denote a universal on the basis of the common characteristic of objects. On the other hand, Vijñānavādins believes that the universal is not so much a property of the object but rather of the cognition. Thus, Bhartṛhari considers verbal convention and cognitional aspect an important criterion, based on which universal is defined in terms of word-meaning.
The universal which is eternal helps the effect. It prompts the causes of the individual and is manifested in the individual which is produced. From the viewpoint of the Advaita, universal and individual are relative terms. What is real is called the universal and what is unreal is called the individual. The universals expressed by words are the unreal manifestations or divisions of Brahman, the highest kind of universal. All words express directly the universal and indirectly Brahman, the absolute reality.
The concept of universal becomes clear when it is compared with that of similarity and collection which look like it but are different from it. They are allied things in terms of diversity and unity. In the cognition of collection, unity figures mixed up with diversity. In the cognition of similarity, first difference figures and then resemblance. In the cognition of universal, only identity figures. The universal is postulated as a separate entity while similarity and collection are not over and above the individuals.
According to the Bauddhas, the cognition of universal is an error. All cognitions are different from one another. Due to an eternal ‘impressions remaining in the mind’(vāsanā), however, cognitions appear to be identical and consequently the concept of universal arises in cognition. According to the Saṃsargavādins, cognition never becomes an object and therefore there is no universal in the cognitions.참고자료
· 없음태그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남아시아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
상캬 사상의 기원과 발전 22 페이지
본 논문의 목적은 상캬(Sāṁkhya) 사상의 기원과 발전과정을 시대적 흐름 속에서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상캬는 인도에서 가장 오래되었으면서도 인도인의 의식과 문화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캬를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인도사상의 핵심 또는 기본적인 토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캬 사상의 기원과 발전과정을 알기.. -
Pilgrimage to the Holy River Ganges: Its Manifestation in Indian Liter.. 24 페이지
There is a unique religious ritual, called 'Pilgrimage to the Holy Land' in Hindu India. In India, there are lots of holy places but the Ganges is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holy place by the Hi..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